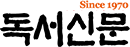[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제목에는 이 연작소설의 많은 것이 함축돼있다. 먼저, ‘대도시’라고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다양한 사람들이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랑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이 소설은 게이 남성의 세 번의 사랑을 어떤 퀴어 장르 소설과도 다르게 그려낸다.
두 번째로, ‘대도시의 사랑법’에서 ‘도시의’라는 단어를 빼면 이 소설의 주제가 보인다. ‘대(大)사랑’, 큰 사랑이다. 도대체 어떤 사랑이 큰 사랑일까. 「재희」에서 주인공과 재희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서로를 이해하고, 편견 없이 바라보는 관계다. 섹스와 결혼으로 이어지는 통속적인 사랑까지는 될 수 없지만 친구 간의 일반적인 우정을 넘어서는 관계, 편하게 말하면 소울메이트. 둘은 서로를 상실하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게 되고, 독자는 이 과정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모호해진다.
암에 걸려 죽어가면서도 게이인 주인공을 그저 치료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이해해 보려 노력하다가도 포기하고 마는 주인공, 그리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연인을 끝까지 이해하려 해보지만 결국 그럴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동시에 전개되는 「우럭 한점 우주의 맛」은 진정한 사랑이란 우주만큼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존재하는 우주를 받아들이는 일일 뿐임을 이야기한다.
“그래서나 그러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러거나 말거나, 너였다고. 나는 그 말이 좋아서 계속 입 안에 물을 머금듯이 되뇌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대도시의 사랑법」 中)
그리고 이 소설의 표제작인 「대도시의 사랑법」과 「늦은 우기의 바캉스」는 연인 규호에 대한 이야기다. 과거 연인 규호에게 자신이 에이즈 환자임을 고백한 주인공이 그때 왜 자신을 받아줬느냐고 묻자 규호가 답한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네 편의 소설들은 다채롭게 빛나는 사랑을 보여주며, 과연 진정 큰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묻는다.
『대도시의 사랑법』
박상영 지음│창비 펴냄│344쪽│1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