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인은 잘 익은 포도의 당분을 발효시켜 만든 술로, 약 6,500년 전부터 즐겨 마셨을 만큼 그 역사가 오래됐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성찬이나 사교행사, 그리고 연인과의 기념일 등 굵직한 행사가 있을 때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와인은 특유의 단맛으로 기분 좋은 취기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모임의 친화력을 높이고 구성원들끼리 화합을 도모하고 싶다면 와인만한 게 없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와인은 ‘화합과 즐거움’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있다. 와인이 전쟁의 빌미가 되거나 전쟁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책 『와인 콘서트』의 저자 김관웅은 “전쟁은 인류 문명을 파괴하고 인간의 본성마저 짓밟는 정말 가장 잔인한 행위이다. 하지만 전쟁은 아이러니하게도 인류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먹거리를 가져다주기도 한다”며 “와인은 전쟁과 참 많이 맞닿아 있다”고 전한다.
먼저, 저자는 잉글랜드와 프랑스 간에 진행된 백년 전쟁을 예로 든다. 저자는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1337년부터 1453년까지 무려 116년 동안 벌인 백년전쟁은 프랑스 왕위계승권을 놓고 벌인 전쟁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보르도 와인을 차지하기 위한 ‘와인전쟁’”이었다고 전한다.
흔히 백년 전쟁은 당시 잉글랜드 왕이던 에드워드 3세와 프랑스의 왕이 된 필리프 6세가 프랑스의 왕위계승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막상 내막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조금 다른데, 저자는 프랑스가 자신들의 영토 내에 있지만 잉글랜드가 소유하고 있는 가스코뉴 지방을 차지하고 싶어서 전쟁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랑스 남부 지방에 위치한 가스코뉴 지방은 지금도 유명한 와인 산지 보르도와 당시 최대 와인 산지 ‘까오르’와 ‘가이약’이 속해있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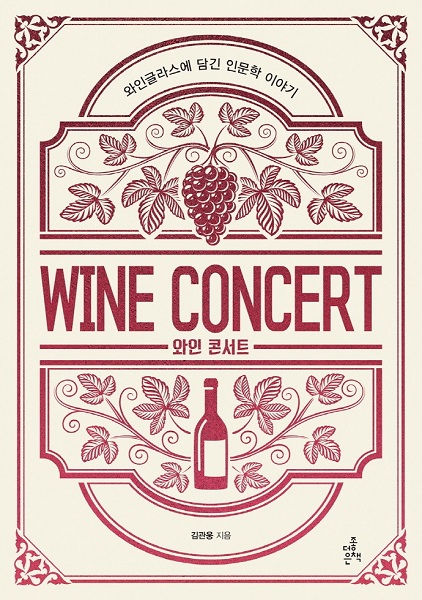
한편 와인은 전쟁의 공포를 잊기 위해 사용된 도구이기도 했다. 저자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진지 하나를 놓고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수십 차례 뺏고 빼앗으며 5만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프랑스 상파뉴의 한 참호 유적지에서는 지금도 주변 땅을 파면 유골과 함께 당시의 와인병이 출토된다고 한다”며 “삶과 죽음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참호 속에서 극한의 공포를 이기기 위해 마시던 술병은 어찌보면 총탄에 부스러진 유골보다 전쟁의 참상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또다른 슬픈 이야기의 배경도 역시 프랑스다. 때는 1945년 5월, 프랑스 동남부 보졸레 지방의 주민들은 전쟁이 끝나가는 것을 느끼자, 전쟁의 포연 속에서 어렵사리 농사를 지은 포도로 와인을 빚었는데,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와인을 꺼냈다. 그해 수확한 포도로 만든 와인을 꺼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저자는 “가족, 친구, 동네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쟁에서 살아남은 기쁨을 나누고 먼저 떠나간 사람들을 애도하는 자리였다”며 “장장 6년에 걸친 전쟁 통에 와인을 제대로 마시지 못한 프랑스 사람들의 눈에선 아마도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흘렀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와인의 이름은 보졸레 누보인데, 이는 프랑스 사람들이 전쟁의 눈물로 빚어낸 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신문 안지섭 기자]


